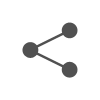매그진 시작
디자인에 있어 '반드시'를 지워보고 싶은 것
2021-08-13
매그진은 매뉴얼 블로그로 시작한다. 시작이란 단어가 끝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끝을 모르는 것은 일종의 성공이다. 반대로 실패는 이 글 뒤로 몇 개의 글이 엄청난 주기를 가지고 남겨지다 멈추는 것이다. 다만 실패해도 상관없다. ‘실패와 무관함’이 매그진을 시작하는 나의 태도다.
돈을 받고 디자인을 제공하는 행위는 설득의 연속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빌리자면 내가 만든 디자인은 나부터 좋아야 하고, 다음 우리 동료, 나아가 클라이언트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좋음을 설득으로 바꿔도 되겠다. 결과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지만 과정에 있어 반드시 설득하겠다는 태도는 지금까지 나의 원동력이자 자부심이다.
한 편 ‘반드시’란 단어에서 내비치고자 한 것은 힘듦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로 모니터 앞에서 낑낑거리느라 어깨는 굽고 목은 거북이가 됐다. 토끼같은 프로젝트 일정에 퇴근 후에도 모니터 속 그림은 머리속으로 에어드롭 됐다. 우리는 간혹 오후 4시쯤 단체 스트레칭 시간을 갖지만 굽어진 어깨를 펴기에 너무 찰나다. 워크숍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우리는 돌이 된다.

여러 해 전부터 매그진 같은 것을 해 보고 싶었다. 왜 하고 싶은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지금 떠 오른 생각은 디자인에 있어 ‘반드시’를 지워보고 싶은 것 같다. 설득을 고려하지 않아보고 싶다. 그리는대로 적는대로 생각나는대로 하고 둔다. 완성에 대한 강박과 갇혀 있는 미감에 대해 새로운 시도도 해 보고 싶다. 디자인에 있어 다른 근육을 써 보는 것. 글에서 출발한다. 끝은 모르겠으나 일단 문은 연다.
느슨한 제안
- 자기다운 것을 남긴다.
-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 톤앤매너 달라도 된다.